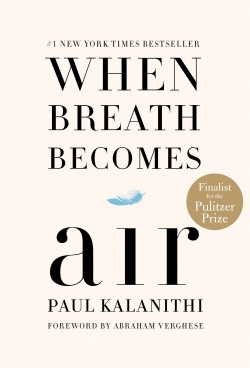대상포진에 걸렸다. 예전엔 '꽃단'으로 불렸던 병이다. 수두바이러스가 몸 속에 숨어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발병하는 병이다. 대체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어서 악명을 떨치는 병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중 일부는 걸렸는지도 모른 채 지나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마다 고통의 편차가 있다. 어떤 이는 너무 아파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한다. 물집(수포)가 생기는 병이지만, 안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 없는 병이다. 관절이 아픈 느낌이 지속되는데, 물집이 있으면 아 이거 대상포진이구나 하고 짐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지 한참 헤매게 된다(의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냥 며칠 지나면 낫겠거니 하다가 된통 당하게 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 특히 등에 대상포진이 발병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