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삶이라는 책 The Book of My Life
알렉산다르 헤몬Aleksandar Hemon(지음), 이동교(옮김), 은행나무
나는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 151쪽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서 아는 건 거의 없다. 학살과 인종 청소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끔찍한 전쟁이었다는 정도. 우리와는 너무 멀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라예보라고 하면 탁구선수 이에리사와 제 1차 세계대전을 떠올릴 뿐이다.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하나, 그 끔찍함으로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실은 한국전쟁이 더 끔찍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알렉산드르 헤몬Aleksandar Hemon은 내가 처음 읽는 보스니아 작가다. 티토가 극적으로 통합한 사회주의국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사라예보 출신의 보스니아 사람, 지금은 시카고에 머물며 영어로 글을 쓰고 있다.
그가 시카고에 머물게 된 연유는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정도이지만, 원하지 않았던 그 정착의 황망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번도 사라예보를 떠나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본 적도 없던 그가 짧은 영어로 시카고에서 버티며 영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의 노력이란, 상상하지 않아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 힘든 과정은 힘든 축에도 속하지도 못한 듯 싶다.
1994년 12월, 나는 당시 보스니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관한 증거를 모으던 드폴 법과 대학교의 국제 인권법 연구소에서 잠깐 봉사활동을 했다. (144쪽)
사진으로는 알아볼 수 있으나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물도 있었고, 도무지 낯설어 도시의 어디쯤에 위치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건물도 있었다. 그로부터 나는 도시 전체를 소유하는 데 굳이 도시 전체를 구석구석 알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하지만 시카고 시내에 자리한 사무실 안에서 나는 아직 내가 모르는 사라예보가 있다는 생각과 비처럼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판지로 된 무대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곳을 영영 알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내 정신과 내 도시가 같다고 한다면 나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내 사적 공간을 시카고로 전환하는 일은 형이상학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시급했다. (146쪽)
이 짧고 담담한 산문집은 그가 어떻게 사라예보를 떠나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시카고에 정착했는지를 적고 있다. 머나먼 타국에서 자신이 살았던, 그 때까지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깃든 도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가. 그래서 이 책의 어느 문단에서는 눈가가 촉촉해지지만 동시에 어느 페이지에는 웃게 된다. 시카고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 알렉산다르 헤몬이 실향의 아픔을 극복해 나가며, 극복해나가는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웃게 된다.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내게 고통이었다. 아직 충분히 젊은 나이였기에 딱히 건강이 신경 쓰이지는 않았지만 내게 있어 축구를 한다는 건 오롯이 살아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축구 없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망망대해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159쪽)
그리고 1995년 여름 어느 토요일,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가 시카고 업타운 호숫가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 축구를 시작한다. 에콰도르 출신의 독일인이 주도로 하는 축구 클럽 같은 곳이었으며, 그 곳에서 축구가 비인기종목인 나라 미국에서 축구를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과 만난 것이다.
선수들 대부분이 업타운이나 에지워터에 살고 있었고 원래는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페루, 칠레, 콜롬비아, 벨리즈, 브라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세네갈, 에리트레아, 가나, 카메룬, 모로코, 알제리, 요르단, 프랑스, 스페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트남,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티베트에서 온 남자도 있었는데, 그는 아주 훌륭한 골키퍼였다. (161쪽)
이 문장을 읽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축구라면 환장하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축구가 하고 싶었을까 상상해 보았다.
스물일곱에 한 달 일정으로 시카고로 온 작가는 보스니아 내전으로 인해 어쩌다가 지금은 미국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알렉산다르 헤몬이 미국 사람이 되어간 과정을 이야기하는 에세이집이다. 실향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이들이 어떻게 파시즘의, 전쟁의 광기로 변했는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사라예보를 떠나 캐나다에 정착하게 되고 한 번의 결혼이 실패하고 또 다른 결혼을 하며,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 둘째 아이가 소아암으로 죽는 과정을 그린다. 소설이었다면 이것이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이 책에서는 작가가 겪은 사건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남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우연히 도서관 서가에서 꺼낸 이 책은 아무렇게 펼친 페이지에서 한 두 문장을 읽은 다음 바로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우연한 만남이었고, 뉴욕커(Newyorker)에서 그의 단편 하나를 프린트하면서 모국어가 아닌 이방인의 언어인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책 속의 짧은 챕터인 <시카고를 떠나기 싫은 이유: 무작위로 뽑은 미완성 리스트> 에서 한 가지 이유를 옮긴다.
10. 애들러 천문관에서 바라본 도심의 심야 스카이라인. 어두운 건물의 불 켜진 창들이 더욱 어두운 하늘에 윤곽선을 그린다. 사방 모양으로 모든 별 무리를 두터운 밤의 장벽에 붙여 놓은 것처럼 막대한 삶의 무게를 담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아름다움.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모르는 창문 하나하나, 창 안에는 건물 청소를 하러 온 심야 근무조 이민자 청소부 하나. (154쪽)
헤몬이 머물게 된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고 지금 한국에 미얀마 사람들을 떠올렸다. 다행히 미얀마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마 헤몬을 품어준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한국도 그런 나라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뜻한 봄 바람 속에서 쓸쓸한 기분이 들 때, 이 책은 조그만한 위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인연을, 지금 살아있음을, 마지막으로 그대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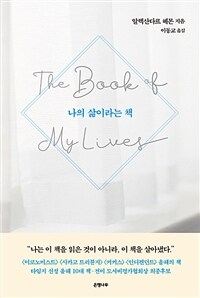 |
나의 삶이라는 책 -  알렉산다르 헤몬 지음, 이동교 옮김/은행나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