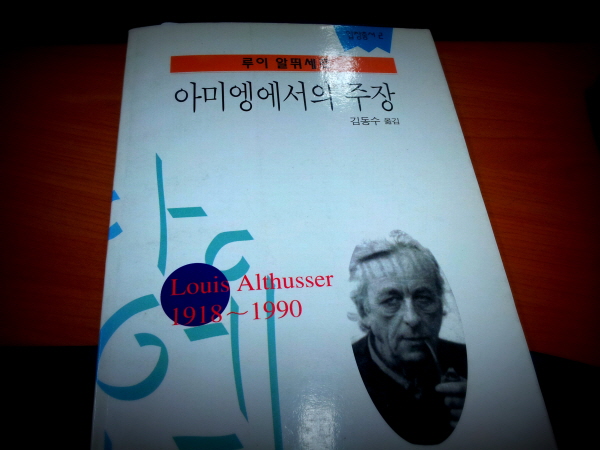우연히 평면화되고 추상화된 근현대미술이 카메라의 발명으로 야기되었다는 동영상을 보았다. 아직까지 저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구나. 놀라웠다. 카메라가 원인이 되어 근현대 미술 양식이 결정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이 설명 방식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현대미술, 즉 평면을 지나 추상으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많은 이들이 카메라가 원인, 인상주의 이후의 현대 미술은 결과로 설명하곤 하지만, 이는 현대미술이 가지는 풍성함, 진지함, 예술적 통찰을 없애는 설명이다. 따라서 도리어 카메라가 얼마나 원근법적인지, 환영주의적인지, 인간의 편견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구인지를 설명하는 편이 낫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대의 예술가들, 특히 영화감독이나 사진작가들은 카메라라는 도구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