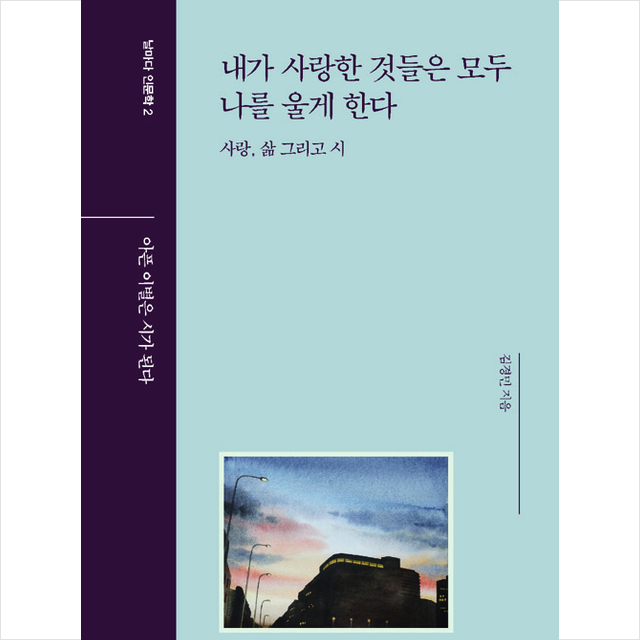
내가 사랑한 것들은 모두 나를 울게 한다
김경민(지음), 포르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그만 두고 아이를 키우며 글을 쓰는 이의 시선집이다. 아마 자신에게 인상깊었던,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시들을 모아, 시마다 짧은 에세이를 붙여 만든 책이다. 시를 읽고 싶은 이들에게, 그러나 시를 어떻게 읽어야할 지 모르는 이들에게 이 책은 참 좋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상관없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으면 된다. 마음에 드는 시가 있으면 두 세 번 읽어도 된다.
이런 책은 참 부담없다. 아무렇게 읽어도 된다. 소리를 내어 읽으면 더 좋다. 나는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술 한 잔을 마시고 난 다음 이 책을 꺼내 읽었다. 좋았다. 요즘 시인이 누가 있는지, 그들은 어떤 시를 쓰는지 궁금해 이 책을 읽었는데, 아, 이런 대부분 아는 시인들이었다. 시집은 읽지 않았어도 대부분 한 두 번 들어본 이름이었다.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 취향이 다르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었다면 더 기쁜 마음이었을 텐데.
대부분의 시들이 좋았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시 몇 편을 옮겨 적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 메모도 조금 붙인다.
* *
발견 8
2층은 너무 낮고, 4층과 5층은 너무 높고, 3층이 투신자살하기에는 꼭 알맞은 높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마냥 즐겁게 놀고 있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곤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2층은 너무 가깝고, 4층과 5층은 너무 멀고, 3층이 세상 구경하기에는 꼭 알맞은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황선하, <<이슬처럼>>, 창비, 1988년
근래의 시인이라 여겼는데, 예전의 시인들은 대부분 다 아는데, 몰랐다. 그냥 무심코 흘려보냈을 것이다. 이 시의 첫 느낌은 좋다. 적절하게 비관적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비판적 거리'라고 할 때, 그 거리는 어쩌면 3층 높이일지도 모르겠다.
* *
오이지
헤어진 애인이 꿈에 나왔다
물기 좀 짜줘요
오이지를 베로 싸서 줬더니
꼭 눈덩이를 뭉치듯
고들고들하게 물기를 짜서 돌려주었다
꿈 속에서도
그런 게 미안했다
- 신미나, <<싱고,라고 불렀다>>, 창비, 2014년
꿈에 나타난 옛 애인도 그녀가 반가웠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오이지의 물기를 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금은 섭섭했을 것이다. 실은 꿈 속에서 반가움을 표하며 안부를 물어야 했는데, 오이지를 건네준 것은 어쩌면 헤어짐에 대한 무안함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시인에게 헤어진 애인은 이래나저래나 미안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그 애인은 참 시인을 미안하게 만들며 헤어졌는지도 모른다. 전략적 헤어짐이라고 할까. 헤어짐의 까닭을 모두 누구 한 명에서 전가시키는 것. 꿈 속에서도 미안하면, 이건 참, 어쩔 수 없는데 말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오이지니까, 언젠가는 물기가 마르거나 입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미안함도 사라지고 한 때의 사랑도 딱딱해지며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때쯤 되면 미안함도 없어지겠지.
* *
문자메시지
형, 백만 원 부쳤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 이문재, <<지금 여기가 맨 앞>>, 문학동네, 2014년
이문재의 시집을 구해 읽지 않은 지 참 오래 되었다. 이문재의 첫 시집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주 가끔 술에 취해 꺼내 읽기도 하니까, ... 시인의 존재를 다시 묻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시인들의 최근 작들을 찾아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