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쪽의 풍경은 환한가
심보선(지음), 문학동네
이유선과 심보선을 헷갈렸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아마 그렇게 오해하고 심보선의 시집들을 사 읽은 듯하다(아닐 수도 있다). 심보선, 그는 아마 한국의 시인들 중 정해진 독자층이 있는 몇 되지 않는 시인일 것이다. 신간 시집이 나오면 온라인 서점 메인에 책 소개가 실리고 여러 신문에도 출간 소식이 실리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가보다는 적어도 돈을 주고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이 정도면 탁월한 것일 수도 있겠다).
나 또한 그의 시집을 사 읽었다. 이번엔 그의 산문집이다. 그리고 읽으면서 이유선을 떠올린 것이다. 나는 왜 이유선의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를 시인 심보선이 썼다고 생각했을까, 이름의 끝자리가 똑같다는 이유였을까. (참고로 이유선의 저 책은 정말 좋은 서평집이다. 왜 그는 더 이상 서평집 같은, 혹은 산문집 같은 걸 내지 않는 걸까.)
심보선의 이 산문집은 (정말 허무하게도) 금방 다 읽었다. 몇몇 흥미로운 구절이 있기는 했으나, 기대하고 구입한 책 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책의 마지막까지 갔다고 할까. 최근 너무 쉽고 빨리 읽혀질 때는 살짝 실망스러운 기분이 든다. 그 이유가 무얼까 생각해본다. 짧은 글들이 대체로 예상가능한 결론을 향하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딱딱하고 건조한 이론서들만 읽어온 것일까. 아니면, ... 쉽고 빠르게 읽힌다고 불평하는 독자는 나 밖에 없을 것같다(이건 장점일 텐데).
아마도 여러 지면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 펴낸 듯한데, 도정일의 산문집에 대해서도 실망했듯이 이 책도 실망스럽다(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한 탓일지도). 최근에 읽었던 헤밍웨이의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든가, 스가 아쓰코의 <<베네치아의 종소리>>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여기에서 이슬아 수필집까진 꺼내지 말자. 하지만 이슬아의 문장에서는 치열함같은 게 느껴지는데, 심보선의 책에는 치열함보다는 여유로움만 묻어나니, 이건 어찌된 일일까. 도정일의 산문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류였는지도 모르겠다. 다 읽고 난 뒤 읽게 된 책 뒤표지의 신형철의 추천사가 얄밉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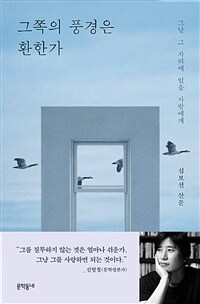 |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  심보선 지음/문학동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