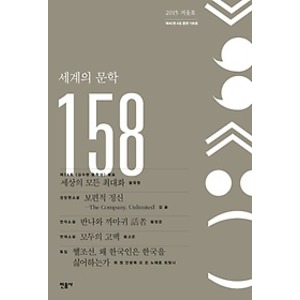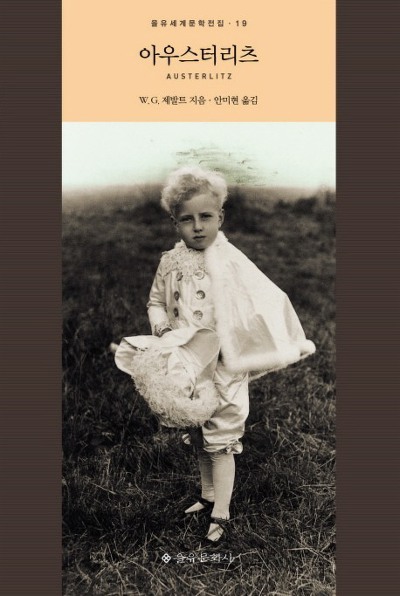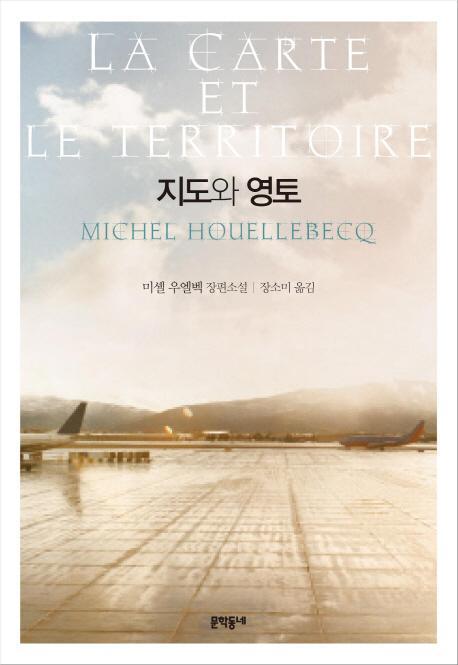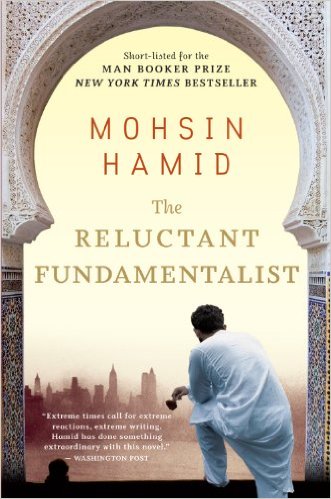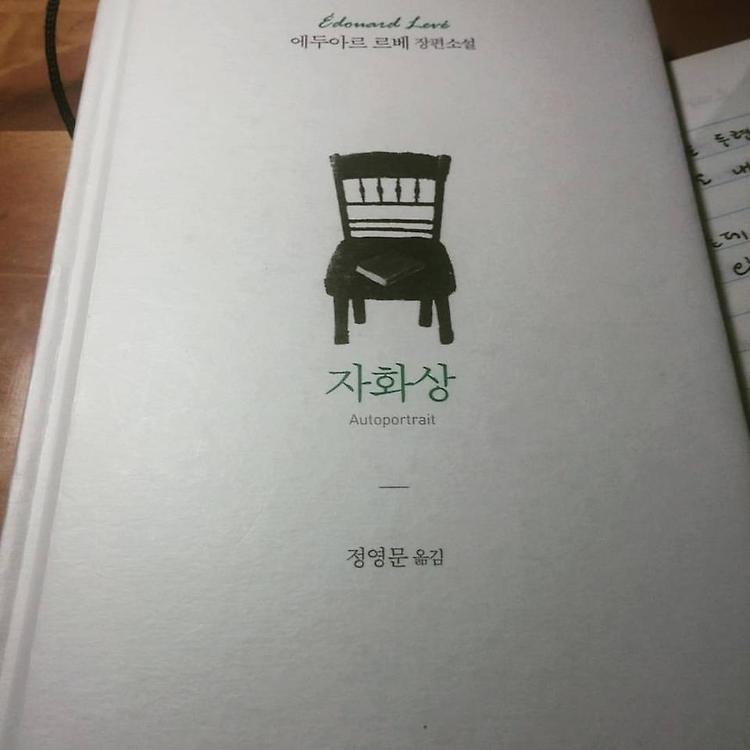책상은 책상이다페터 빅셀(지음), 이용숙(옮김), 예담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경우를. 채 30분도 되기 전에 다 읽은 이 소설집. 뭔가 생각하기도 전에 금방 끝나버리는 소설. 그리고 누구나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짧은 소설들. 하지만 페터 빅셀은 이 소설들을 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하기엔 지금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주인공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남자라는 사실이다. 정서적으로 유연한 여성들에 비해 남자들은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사회와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젊은 작가 빅셀이 고집 세고 편협한 이런 노인들을 더 없이 따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