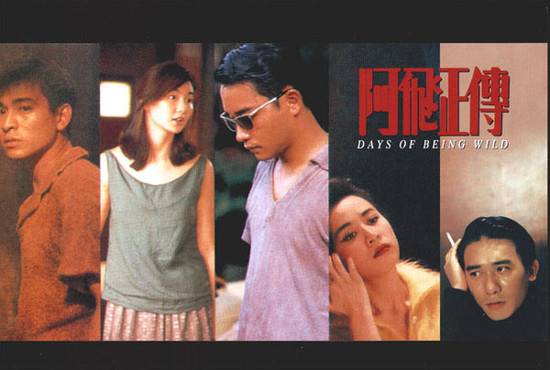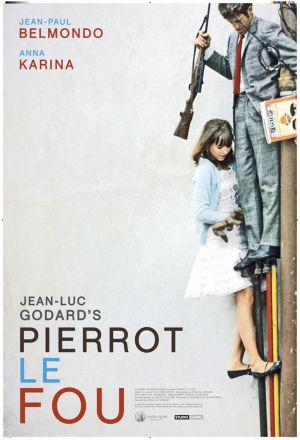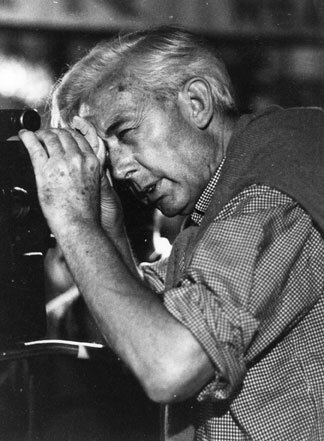오전 회의를 끝내고 내 스타일, 즉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난 다음 판단하려는 이들은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5월의, 낯선 여름 같은 대기 속에 느꼈다, 강남 차병원 사거리에서 교보생명 사거리로 걸어가면서.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했고 읍소를 했다.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대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어떤 일은 급하게 처리되어야만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니, 읍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수의 외주사를 끼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가. 5시 반, 외주 업체 담당자, '내가 IT 개발자 출신인가'하고 묻는다. 차라리 '작업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에게 더 어울린다고 여기는 터인데. (* 여기에서 '작업'이란 '예술 창작'을 의미함) 그리고 오늘 '멘탈붕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