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창동거리에서 어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길, 동성동인가, 남성동 어디쯤 있었던 레코드점에 들어가 구한 음반이 쳇 베이커였다. 그게 94년 가을이거나 그 이듬해 봄이었을 게다. 그 때 우연히 구한 LP로 인해 나는 재즈에 빠져들고 있었고 수중에 조금의 돈이라도 들어오면 곧장 음반가게로 가선 음반을 사곤 했다.
어제 종일 쳇 베이커 시디를 틀어놓고 방 안을 뒹굴었다. 뒹굴거리면서 스물두 살이 되기 전 세 번 정도 손목을 그었던 그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삶의 치열함이라든가 진정성 같은 거라든가.
스무살 가득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 탓일까. 아직까지 인생이 어떤 무늬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도통 아무 것도 모르겠다. 문학도, 예술도 마찬가지다. 이집트 예술가의 진정성과 현대 예술가의 진정성은 전적으로 다른 양식을 향해 간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탓함을 당할 이유도 없다. 나라는 개별자만 있을 뿐, 보편적인 개념으로 날 구속할 순 없다.
그런데 이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일인가. 내 삶의 가치나 의미 같은 건 순전히 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가질 뿐, 이 건조한 도시의 거리에선 아무 가치도,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니.
누군가 내 옆에 누워 자기가 누렸던 사랑의 기억을 더듬기 위해 내 사랑의 흔적을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같다. 기억의 아련함. 그 때 내가 한 말은, 사랑은 지나가면 그저 잊혀질 뿐, 그걸 되새기기 위해, 그걸 되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 ...,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 하긴 그 때 내 옆에 누워있던 그 이는 바로 떠나버렸고 그 이후 소식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꿈이었던가, 아니면 내가 쓴 소설 속이었나.
과거는 중첩되어 쌓여져가고 가끔 내 마음 안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올 때만 되살아날 뿐이다.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뿐. ‘이제 네가 싫어졌어. 그 뿐이야’라고 말했던, 나에게 청혼했던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가끔 과거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내 폐 깊숙한 곳의 H2O를 사라지게 한다. 금세 호흡곤란을 느끼며 자리에 눕는다. 그렇게 누워 남극의 얼음들처럼 천 년이고 만 년이고 그렇게 잠만 잤으면. 우리 인간이 아는 영원함이란 고작 몇 천 년이거나 몇 만 년 수준이다. 영원함이란 애초 존재하지 않는 상상적 개념일 뿐이다. 그러고 보면 그런 상상적 개념은 너무 많고 그런 개념에 목을 매는 꼴이라니.
당인리 발전소 안 길에 벚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다. 하지만 꽃향기는 내 몸에 닿지 못한 채 강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꽃을 입 안 가득 씹어 먹지 않는 한, 순결한 꽃향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건네지 않았다.




멀리 보이는 가양대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앞 강물 위의 백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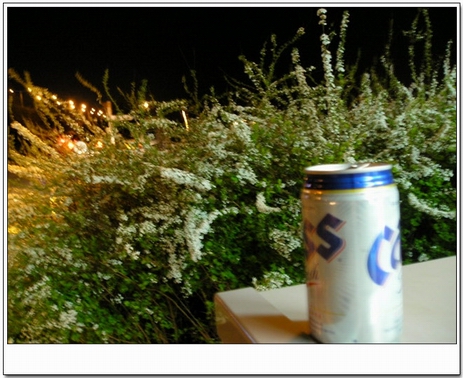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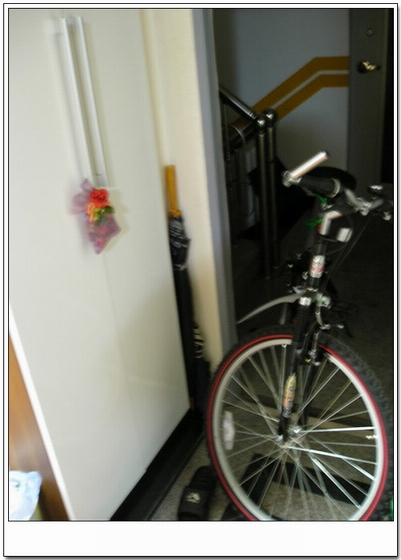
일요일 난데없이 자전거 가게를 방문한 이에게 팔려 고단한 하루를 보낸 내 머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