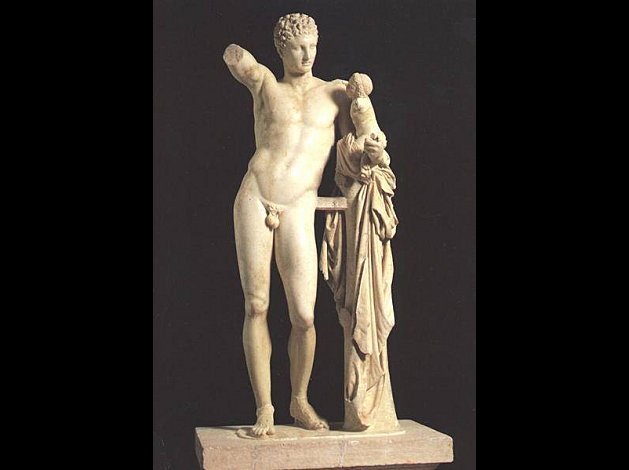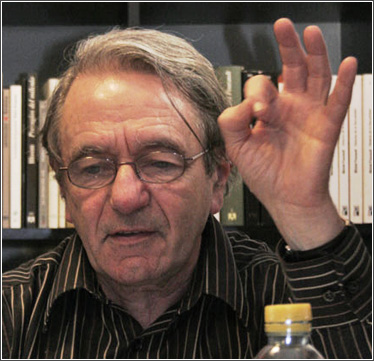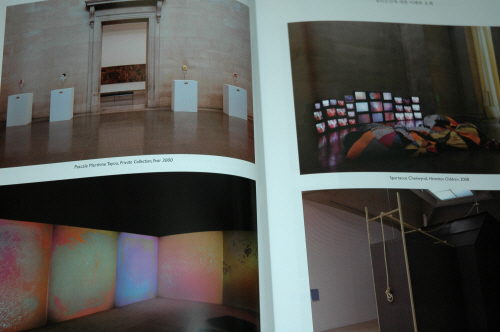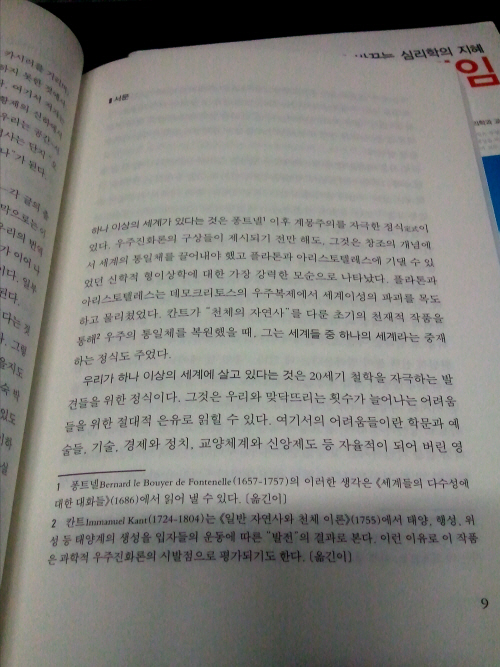결국 철학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말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오랜 철학적 탐구가 세계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철학은 기껏해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왜 모를 수 밖에 없는지, 새로운 앎은 어느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줄 뿐이다. 이것이 몽테뉴가 말한 바 "내가 무엇을 아는가?"의 의미이다. 따라서 철학은 우리에게 겸허하라고 말한다. 오랜 탐구 끝에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큰 무지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또한 무지에 잠기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위대했던 니콜라우스 쿠자누스가 신과 관련해 "무지無知의 지知"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조중걸, '아포리즘 철학', 서문 중에서, 한권의 책 아포리즘..